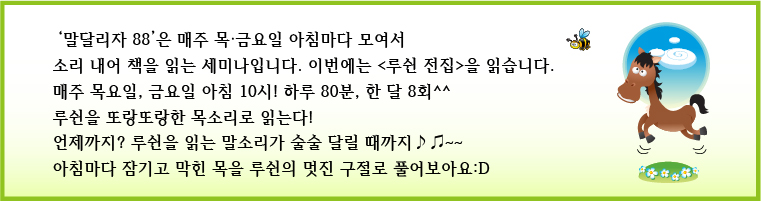무엇을 쓸 것인가는 하나의 문제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도 또 하나의 문제이다.
올해는 그다지 글을 쓰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망위안』잡지에 대한 기고는 특히 적었다. 나 자신은 그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다. 말을 하자면 무척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 잡지의 종이가 너무 고급스러웠기 때문이다. 어떤 때 무언가 잡감이 써지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대단한 의미도 없다고 느껴져서, 저런 새하얀 종이를 더럽히지 않고자 곧 낙담해서 그만두어 버렸다. 좋은 글 또한 없었다. 나의 머릿속은 그만큼 황량하고 천루(淺陋)하며 공허하다.
물론 논의할 만한 문제는 우주에서 비롯하여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있다. 그밖에도 문명이나 문예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도 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으며, 이후에 이야기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궁무진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생각건대 작년에 샤먼에 죽치고 있을 무렵, 남들이 나를 몹시 꺼려하여 마침내 “귀신을 공경하되 이를 멀리하는” 식의 대우를 받고 도서관 이층의 한 방에 모셔졌다. 낮에는 그래도 도서관 관원이나, 파손된 책을 수리하는 직원, 열람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밤 아홉 시가 지나면 모두 뿔뿔이 돌아가 버려 거대한 양옥 속에 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정적 속으로 가라앉아 갔다. 정적은 술처럼 진해지고 가벼운 취기를 느끼게 했다. 뒤편의 창으로 바라보면 우뚝 솟은 바위산에 숱한 하얀 점이 보인다. 무덤 무더기이다. 외따로 노란 불빛이 보이는 것은 난푸퉈사(南普陀寺)의 유리등이다. 앞쪽은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되어 어슴푸레하고, 흑색 솜과 같은 밤의 색깔은 곧장 가슴 깊은 곳까지 덮쳐 온다. 나는 돌난간에 기대어 먼 데로 눈을 돌리고 나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인다. 아득한 사방에서 헤아릴 수 없는 비애와 고뇌와 영락과 사멸이 이 정적 속으로 뒤섞여 들어와 그것을 약주로 바꾸어 빛깔과 맛과 향기를 더한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인가 쓰고 싶었는데 쓸 수 없었고, 쓸 도리도 없었다. 이것도 내가 말했던 “침묵하고 있을 때 나는 충실함을 느낀다. 입을 열려고 하면 공허함을 느낀다”의 예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 고뇌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그것은 담담한 애수이며 더구나 얼마쯤의 유쾌함마저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에 접근하려 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아득해져서 끝내는 나 혼자 돌난간에 기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나 자신의 노력을 잊어버린 그 후에야 비로소 담담한 애수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종말은 대체로 그다지 신통치 못했다. 발에 바늘로 찔리는 듯한 통증이 생겨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철썩하고 손으로 따끔한 데를 때린다. 동시에 모기가 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다. 애수니, 밤의 색깔이니, 모두 구천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린다. 게다가 기대고 있던 돌난간마저 이제는 마음속에 없다. 더구나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것이지, 회상해보면 그 당시에는 돌난간조차 염두에 없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역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하나뿐인 반당의자(半躺椅)에 앉아서 모기에 물린 자국을 문지른다. 문지르는 사이에 통증이 가려움으로 변하고 조그마한 혹으로 부풀어 오른다. 나도 문지르다가 긁적거리거나 꼬집거나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러다가 가려움이 아픔으로 바뀌면 어느 정도 편해진다.
그 다음은 더욱 신통치 못하다. 전등 아래 앉아서 유자를 먹는 정도이다.
한낱 모기가 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은 역시 절실하다. 쓰지 않아도 된다면 물론 그 쪽이 편하지만, 만약 꼭 써야만 한다면 생각건대 이런 작은 일을 쓸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또한 그날 몸으로 겪은 일을 결코 명확하고 절실하게 쓸 수도 없다. 하물며 천 번 만 번 물린다 하더라도 혼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좀처럼 써지지 않는다.
니체는 피로 써진 책을 읽고 싶어했다. 그렇지만 피로 써진 문장은 아마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장은 어차피 먹으로 쓰는 것이다. 피로 써진 것은 혈흔에 불과하다. 물론 그것은 문장보다 더욱 감동적이며, 더욱 직감적이고 분명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빛이 바래기 쉽고 지워지기 쉽다. 이 점은 아무래도 문학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무덤 속의 백골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영구성을 근거로 소녀의 연분홍색 볼을 경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쓰지 않아도 된다면 물론 그쪽이 편하지만, 만약 꼭 써야 한다면 생각건대 제멋대로 써야 한다. 어쨌든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 이것들은 시간과 더불어 사라져가야 한다. 설사 혈흔보다도 오랫동안 선명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인이 행운아이며 총명하고 기지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다만 진짜 피로 써진 책은 물론 예외이다.(《삼한집》, <어떻게 쓸 것인가?-夜記 1> 중에서)
: 무엇을 쓸 것인가. 쓸거리는 많다. 우주, 사회, 국가에 이르는 문제에서부터 문명이나 문예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래 전부터 수많은 이들에 의해 탐구되어왔던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아무 것도 쓸 수 없었다고 말한다. "황량하고 천루하며 공허"한 그의 마음 속에는 별다른 의미도 없는 말들만 맴돌았다. 우주와 세계...이 모든 것이 공허했다. 그는 정적 속에 취해있었다. 시선은 무덤이 있는 곳을 향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고요속에서 그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자기 자신의 심장소리였다. 그 순간 이런 깨달음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몸을 뚫고 나오는 말 외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겠는가.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실존이다...
비애와 고뇌, 영락과 사멸이 침묵 속에서 빛깔과 맛과 향기를 더해갔다. 무상한 것들이 마음을 인연하여 생겨났다 사라졌다. 그가 그것에 접근하려하면 거기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루쉰이 응시한 어둠, 공허 속에서 그는 무상감과 충만감을 동시에 느꼈다. 공허 속에서 그가 부단히도 무언가를 쓰려한 건 그 때문이다. 명상 속에서 그는 고통(苦)의 본질과 해결책, 그것을 표현할 말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고작 모기에 물렸을 때의 따끔함과 그것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조차 금새 사라져버릴 아픔이어서 명확하고 절실하게 쓸 수도 없었다. 인류의 고통이니 대의니 하는 것들에 대해선 어떠했겠는가. 루쉰은 그런 무책임한 말들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었다.